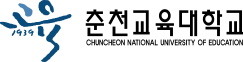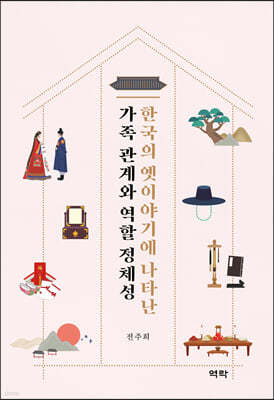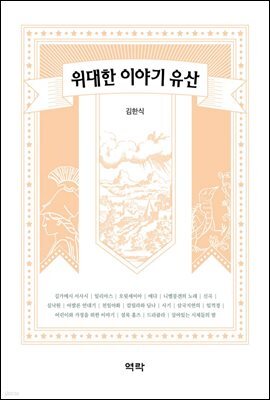예술혼과 운명의 언어
- 저자
- 김종회 저
- 출판사
- 도서출판 역락
- 출판일
- 2022-08-26
- 등록일
- 2023-11-28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2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과 마주쳤을 때, ‘운명’이란 말이 떠오른다. 뜻대로 할 수 없기에 운명인 것이다. 그러기에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세네카는 “운명에 저항하면 끌려가고 순응하면 업혀간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운명에 몸을 맡길 수 있어도 그것에 관여할 수 없다. 인간은 운명이라는 실을 꼴 수 있어도 그것을 자를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의 작가 이병주는 그의 소설 여러 곳에서 “운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모든 토론은 종결이다”라고 썼다. 삶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 ‘이 길 밖에 없으리니’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 운명의 주박(呪縛)을 만난 경우에 해당한다. 문학 또한 마찬가지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작품을 생산하는 그 곤고한 과정에 일생을 건 문인들에게는, 문학이야말로 외길의 운명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때 운명의 강심(江心)에 스스로를 던지는 일이,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의지가 더 우세한 선택이라는 데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 선택의 당사자는 눈앞에 다가온 운명을 외면하지 않고 흔쾌히 수용한 것이 된다. 여기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G. 킹켈이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자신이 만든다”라 하고, F. E. 가이벨이 “운명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동요하지 않고 운명을 짊어지는 용기다”라고 한 말을 납득할 수 있다. 심지어 이병주는 『관부연락선』에서 “운명...그 이름 아래서만이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한 작가나 시인이 가진 ‘꺼지지 않는 불꽃’과도 같은 예술혼은, 그렇게 문학이라는 운명을 만나 제 소임을 다한다. 문학이 함께 이루는 울울창창(鬱鬱蒼蒼)한 숲 가운데서 제각기 하나의 나무로 서 있는 작가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제 몫의 운명을 걸머지고 사유(思惟)하며 글을 쓴다. 그러므로 한 작가의 한 작품을 읽는 행위를 두고, 단순한 독서를 넘어 좀 더 진중하게 말하자면 곧 그의 운명을 읽는 일이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은 한편으로는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그 작가에게 접근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창작심리학적 바탕 위에서 그의 내면세계를 검색하는 것이 된다. 작가, 시인, 수필가 등 여러 문인의 작품과 동행하는 이 책에 ‘예술혼과 운명의 언어’란 표제를 붙인 이유다.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되었다. 1부 ‘운명의 길목에서 꽃핀 문학’은, 한국 현대문학의 주요 작가들이 자신의 시대와 문학의 접점에 이르러 어떻게 그 운명론적 현장을 소설로 표현했는가를 살펴보았다. 2부 ‘삶과 문학의 조화로운 만남’은, 그 후대의 작가들이 현실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문학의 정화(精華)를 꽃피우려 애썼는가를 궁구(窮究)했다. 3부 ‘감성의 극점과 내면의 성찰’은, 우리 문학의 주요 시인들 그리고 운명애의 자각으로 시 창작에 투신한 시인들이 어떻게 시적 감성을 고양하고 이를 통해 내면의 자아 발견에 도달하는가를 탐색했다. 4부 ‘이중문화 환경과 시적 발화’는 미국 뉴욕·LA·플로리다 등 여러 곳에서 이중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국어의 숨결을 붙들고 시를 쓰는 시인들의 시 세계를 추적했다. 그리고 5부 ‘문학이 공여하는 균형감각’은, 근대 이래 지금까지 수필, 잡지 등 여타 장르와 문화론에 관한 글들을 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