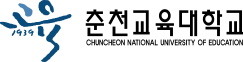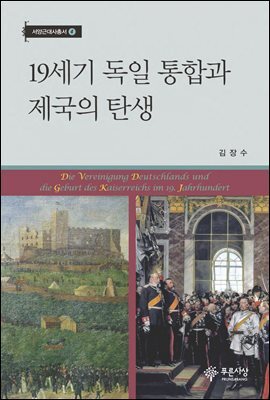달의 알리바이
- 저자
- 김춘남 저
- 출판사
- 푸른사상
- 출판일
- 2019-05-03
- 등록일
- 2020-02-10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7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시인의 시는 사적 사연을 진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물과 장소를 객관적 형태나 ― 「동상동」의 “혹처럼 자리한 동네”나 「산복도로」의 “곡선과 경사”의 “고지대 가슴”이라는 표현과 같이 ― 시적 알레고리로 육화하는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시 창작의 일반적인 수사 전략이긴 하지만, 이런 작업이 쉬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고단하고 힘들었던 생의 내력을 모사하는 순간에는 감상적 자기 위안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김춘남의 시는 초월을 향한 구원의 몸짓이 아니라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 시의 이니스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현실 인식(“실측의 길”)을 보여준다. 시든, 삶이든, 그것은 무수한 생의 고비를 대면하면서(“고비는 비단길이 아니야”), 그 난관을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서는 여정이다. 그래서 시인은 “흔들리는 고비를 잘 넘어가려면 마음의 고삐 꽉 붙잡아야”(「고비사막」) 한다고 얘기한다. 시인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겨진 생의 비극적 사연에 주목하거나(「활짝 핀 홍매화 보기 됴은 봄날」), 신기루 같은 세상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거나(「허구한 나날의 허구」), 또 동물을 스태미나의 대상으로만 삼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비꼬면서(「염소는 힘이 세다」), 물욕의 위험을 경계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불로소득」)은 그 때문이다. 시인은 자유로운 세계를 꿈꾸며 호구지책에 붙들린 삶과 과감히 결별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시적인 사건이다. 시와 삶의 여백에는 수많은 “틈”(「빈터」)이 존재하고 있다. 그 공간이 절망인지, 희망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김춘남의 시가 말년의 양식이 창조하는 자유의 길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 시집에서 보여준 시적 통찰에 값하는 언어적 혁신과 탐구 역시 보태져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현대시가 관조적 크레바스(“빈틈”)로 추락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시인의 힘겨운 도전에 “건투”를 빈다. ―박형준(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문학평론가) 해설 중에서